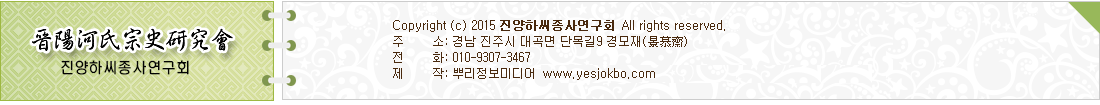|

하한정
함양읍 대덕리 솔숲에 있는 정자로 1905년에 세웠고 위수(渭叟) 하재구(河在九)가 수양하던 곳이다. 하재구는 진사 하석문(河錫文)의 아들로 철종 때 진사에 입격하고 고종 때 의관(議官)을 지냈다. 동학란 때 폭도들을 진압케 하여 고을을 편안케 하였다. 정자에는 그 조카 하기현(河琪鉉)과 한말(韓末) 순국시인(殉國詩人)인 매천(梅泉) 황현(黃玹) 등의 시판(詩板)이 있다.
하한정 상량문(夏寒亭上樑文)
이야기하건대 대개 기괴한 바위에 푸른 털은 이미 뿔 있는 용의 천길 모습을 이루고 너울거리는 흰머리는 애오라지 뱁새가 빌린 한 가지에 고기와 새가 이상한 모습을 본받아 이를 돌이켜 보건대 삼백 년이 지난 고향에 제비와 새가 날아올라 축하를 하니 저 수천 그루의 솔숲에 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물을 대고 북을 돋우고 하였으니 오직 나의 고향이니라. 옛날 우리들 어릴 적에 고기를 낚고 노닐 때에 가히 어떤 물과 어떤 언덕을 사랑했나니 맑은 위천수는 서쪽에서 흘러와 한 구역을 열어서 맑은 거울을 이루고 지리산은 남쪽을 가리켜서 일만 봉우리 옥녀비녀가 십 리를 뻗은 무성한 숲과 서로 바라보면서 구름속의 신선이 철쭉 꽃향기 속에 낚싯대를 어루만지며 퇴계 선생의 하표(遐表)가 일찍부터 있듯이 읍(揖)하고 만나는 곳에 따라 생각나서 도시락으로 위안하니 또한 지극한 즐거움이 있어 마음에 맞는 지팡이와 신발이 먼 곳에 있지 않으니 하필이면 굽혀서 힘쓰겠는가. 돌아보건대 쓸모없고 흩어져 있는 한 문장에 문득 해질 무렵에 미쳐 무너질듯한 경치의 운명이 쇠하여 떨어지니 거의 같이 이른 봄 윤년에 막힌 모퉁이가 여러 번이나 세상의 변천을 거쳤으니 재앙이 낀 운수에 난과 창포가 아홉 이랑이라. 마음속으로 엉키어 마침내 초나라 상수(湘水)에 반하고 기국(杞菊) 몇 두둑이 한가로이 한(漢)나라 산속에 방해 되지 않으며 오직 늙은 잣나무는 또한 사람들의 사랑하는 수석과 금서(琹書)의 즐기는 바로써 숨은 노나무는 마땅히 세상과 더불어 잊히고 연운(烟雲)과 사조(沙鳥)는 하루의 띠집을 지으니 그로 인하여 두 칸의 죽루(竹樓)를 지어서 매양 도팽택(陶彭澤)의 동수(冬秀)의 음(吟)을 읽고 늦은 철을 생각하여 은밀히 왕망천(王輞川) 하한(夏寒)의 글귀를 취하니 이에 아름다운 이름을 주어 근심스러운 구름 천장이 엄연히 장사의 둔한 관같이 서있고 만휴(萬髹)의 풍월을 읊음에 비파와 생황을 연주하기에 옷깃을 헤치고 바람에 서서 어릴 적 등을 햇빛에 쪼이여 혼연히 깨우치니 현묘한 이치가 피부에 핍박함을 느끼도다. 필생의 구번(邱樊)에 맹서하고 빙설로써 지조를 고치지 아니하며 차라리 바위 구렁에서 말라 죽을지언정 즐겨 도리(桃李)와 더불어 고움을 다투리오. 귀신이 고명(高明)함을 틈내어 어찌 얇게 낀 구름과 떨어지는 별의 웅장하고 화려함이 부러우며 땅이 넓으니 상쾌하여 또한 청풍명월의 말비(抹批)가 족하고 좋게 때맞춰 오니 가히 잔을 들어 술자리를 용납하고 좋은 때에 홀로 길을 스스로 따르니 경권(經卷)과 다로(茶爐)에 가깝도다. 선롱(先壟)과 선려(先閭)가 감히 가로되 비조(妣祖)로 이어져서 같이 한 나무와 하나의 돌을 차라리 자제의 아름답지 못함을 걱정할지언정 얼굴의 평안함을 신뢰하나니 비록 이가 나빠졌기에 이 섭섭함이 비둘기의 못남이 구충의 숭대를 바라지 못함과 같고 학과 더불어 같이 깃들면서 가히 천세를 기약함이라. 대개 잠간 수레를 멈추고 영착(영斮)의 노래를 들어보소. 아랑이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맑은 간수 냉랭히 동으로 흐르네. 비파를 당겨서 나는 세사 하고자 하나 솔바람이 동에서 불어오도다. 아랑이 들보를 남에 던지니 춘수는 우리 집의 남과 북이라. 그 가운데 백구는 나와도 같이 수연(수然)히 강남의 꿈을 꾸네. 아랑이 들보를 서에 던지니 집을 찾아 우는 새야. 날이 저문데 저녁연기 한 아름 어느 곳인지 내 집의 가까운 곳 서쪽에 머무네. 아랑이 들보를 북에 던지니 바람소리 주기(酒旗)는 물 북쪽이라네. 마심을 파하고 그대는 돌아가라. 비로소 한잠 부치니 맑은 바람 북창에 불어오도다. 아랑이 들보를 위에 던지니 한 움큼 띠집이 머리 위를 덮도다. 나를 부르는데 높은 소나무는 방해되지 않으리니. 흰 구름이 찾아와서 난간위에 잠드네. 아랑이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이슬비에 뽕나무와 삼은 크고 작도다. 들녘의 늙은이 성은을 알거늘 멀리 서울의 해지는 곳 바라보도다. 간절히 원하되 상량한 뒤에 소나무와 같이 무성하여 태평한 사철에 푸르름이 길이 머물고 베지 말고 치지 말라. 한 점의 검은 티끌도 이르지 말고 나에게 가채(可採)하고 가어(可漁)하여서 한 곳에 모을지니 이야기는 흡사히 거룩하신 우리 가문 자랑이니라. 군현(群賢)을 모아서 창서(暢敍)하기에 진나라 때에 난정(蘭亭)을 사양하지 아니하나니.

|